[팜뉴스=김민건 기자] 혈액암 치료제들이 글로벌 임상연구에서 보인 성과에 비해 국내 급여 적용·확대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26일 업계에서는 이달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다룬 한국얀센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다라투무맙), 한국아스텔라스 급성골수성백혈병(AML) 표적치료제 조스파타(길테리티닙) 급여 기준 확대 과정에 불만이 적지 않다.
두 신약이 글로벌 연구를 통해 기존 치료제 대비 뚜렷한 임상적 혜택을 확인, 별다른 대안 치료제가 없음에도 허가 적응증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스파타는 지난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FLT3(FMS-like tyrosine kinase 3) 변이 재발·불응인 급성 골수성백혈병(AML) 표적치료를 적응증으로 허가됐다. 이에 2022년 3월 조스파타 40mg 1정당 21만4100원의 급여 상한액을 신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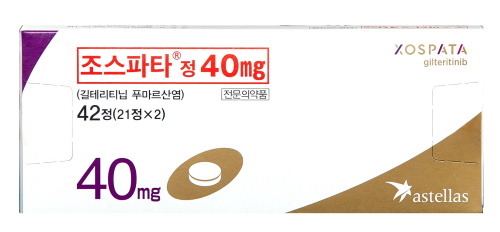
허가 적응증을 보면 조스파타는 FLT3 변이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인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심각한 부작용 등이 발생할 때까지다. 신설한 급여 기준은 이보다 적용 폭이 좁다. 조스파타 단독 투여 시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의 관해유도요법으로 2주만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고려한 2주기까지 총 4주기(4달) 투약만 급여를 인정했다.
초기 관해유도요법으로 암세포를 제거 후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 즉 재발 확률을 줄임으로써 장기적 생존이 가능한 경우로 급여 대상을 제한한 셈이다.
이러한 급여 기준이 허가 적응증에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 지난 3일 암질심에서다. 암질심은 최대 4주기 투약만 적용하는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잘렉스도 조스파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2017년 국내에서 프로테아좀억제제(PI)와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한 적어도 3개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에 첫 허가 적응증을 받았다.

그 이후 2019년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 환자 중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잘렉스, 보르테조밉, 멜팔란 및 프레드니솔론 병용(DVMP, 1차 치료), 그리고 다잘렉스,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 병용(DRd, 2차 치료)으로 허가 적응증을 넓혔다.
조혈모세포이식 적합한 경우에는 다잘렉스,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 병용(D-VTd, 1차)과 다잘렉스,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 병용(DVd, 2차)을 쓸 수 있게 변경됐다.
다만 이 같이 2019년 1·2차 병용으로 허가 적응증을 확대했음에도 재발·불응성 환자의 4차 치료 이상 단독 투여를 제외하고는 급여 적용이 안돼 100% 환자 부담으로만 처방해야 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지난 3일 암질심에서다. 암질심은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유도요법으로 다잘렉스+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DVTd) 4제 병용에 새로 급여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기준도 유도요법에 한정된 것이다. 유도요법은 다발골수종 치료에서 자가조혈모세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한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한 경우는 다잘렉스 4제 병용이 급여가 되도 본인 부담으로 쓸 수밖에 없다. 특히, 재발·불응성이 잦은 다발골수종 질환 특성상 유지요법에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의료진·환자는 임상서 보인 결과에 기대감이 크지만...
허가 적응증 대비 급여 기준 설정, 확대가 늦어지고 있는 두 치료제이지만 임상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조스파타의 경우 허가 임상 ADMIRAL에서 FLT3 변이 재발·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대상으로 전체생존율(OS) 중앙값 9.3개월을 기록했다. 대조군(항암화학요법)의 5.6개 대비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연장시킨 결과다.
또한 항암화학요법 투여군 대비 완전관해(CR)나 부분적 혈액학적 회복을 동반한 완전관해(CRh) 환자 비율은 34% 대 15%로 조스파타군이 대조군 보다 2배 높은 결과를 냈다. 무사건 생존기간(event-free survival)은 조스파타가 2.8개월로 대조군 0.7개월 대비 길었다.
완전 관해에 도달한 FLT3 변이 환자 절반이 재발을 경험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이같은 임상적 효과를 보이는 표적치료제는 조스파타가 유일하다.
다잘렉스의 경우 CASSIOPEIA 연구를 통해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환자의 1차 치료에서 다잘렉스 4제 병용(DVTd) 대 보르테조밉 3제 병용(VTD)을 비교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다잘렉스는 통계적으로 대조군 대비 유의한 무진행생존기간(PFS) 결과를 냈으며, 전체반응률(ORR)도 92.6%로 대조군 89.9%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작년 8월 공개된 GRIFFIN(2상) 연구에서는 다잘렉스 4제 병용(D-RVd)과 레날리도마이드 단독 유지요법 이후 RVd 투여 효과를 비교한 결과, 다잘렉스 4제 요법이 더 긴 무진행 생존기간과 더 높은 미세잔존질환 음성 비율을 보여 질병 진행과 사망 위험을 55% 줄일 수 있었다.
작년 12월에는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다잘렉스, 보르테조밉, 덱사메타손 3제 병용(D-Vd)과 덱사메타손 2제 병용(Vd) 연구인 CATOR 3상도 공개됐다. 이 연구에서 다잘렉스 투역군의 전체생존기간 중앙값(추적관찰 중앙값 72.6개월, 약 6년) 시점에 49.6개월을 기록했다. 2제 병용군 38.5개월 대비 사망 위험을 26%나 줄인 것이다.
다발골수종 5년 상대생존율은 33.2%다. 세 번 이상 재발 또는 치료에 실패한 환자의 기대 여명은 5.1개월로 완치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1/2상 임상만으로 FDA 허가를 받은 치료제가 다잘렉스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윤일규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위험분담제 도입 5년,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기현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치료 옵션을 적극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발골수종 4차 치료에서 관심을 모은 다잘렉스를 두고 한 발언이었는데 2023년에도 급여 처방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 의료계에서는 두 치료제가 좋은 임상 효과를 보였음에도 급여 기준이 임상적 혜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 확대에 나섰음에도 "왜 처음부터 허가 적응증대로 급여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효과 좋은 치료제를 의학적 근거 없이 제한했다는 시선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조스파타, 다잘렉스 뿐만이 아니라 많은 혈액암 신약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백혈병환우회는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만 70세 이상 고령의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체력이 되지 않거나 고액의 비급여 조혈모세포이식 비용 때문에 이식을 하지 못한다"며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FLT3 변이 환자는 조스파타를 사용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암질심을 통과한 조스파타로 생명 연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건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