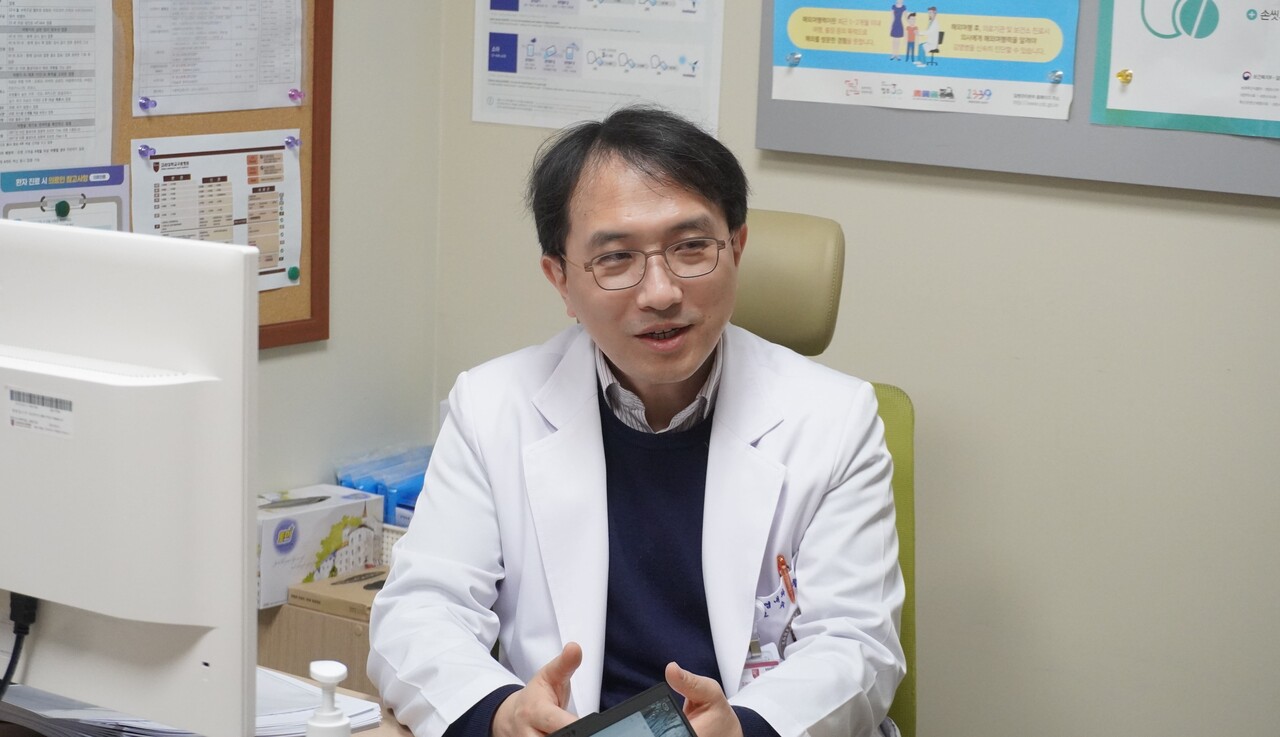
[팜뉴스=김민건 기자] 국내 20~30대 HIV 신규 감염인이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국내 누적 감염인 수는 1만9745명, 신규 감염인은 1005명으로 64.1%(644명)가 20·30대였다.
젋은 연령층이 늘었지만 강력한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갖춘 최신 치료제 등장으로 장기간 생존하며 일상생활로 되돌아오는 게 가능해졌다.
송준영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소 등 HIV 진단 및 치료가 정상화되면서 줄어들었던 신규 환자가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다"며 "HIV가 당뇨,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에 진료를 받던 분들은 주기적으로 내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젊은 연령층에서 신규 환자가 늘어난 만큼 부작용 우려를 줄이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장기 치료 전략'도 중요해졌다.
국내에서 처방 가능한 대표적인 HIV 치료제 중에는 도바토(돌루테그라비르+라미부딘)가 있다. 기존 치료 경험이 없는 HIV 감염인(naïve)뿐만 아니라 치료 경험 있는 HIV 감염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고정 용량 2제 요법 단일 정제다.
임상과 RWE 연구를 통해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물론 안전성과 전반적인 지질 수치 개선 등을 확인했으며, 송 교수와 같은 국내 의료진들이 도바토 효과를 임상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 기존 3제 요법을 쓴 환자가 도바토 2제 요법으로 처방을 교체한 경우에도 장기 추적을 통해 바이러스 억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팜뉴스는 최근 고대구로병원에서 송 교수를 만났다. 송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HIV 장기 치료 전략이 왜 중요해졌는지, HIV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전한다.
다음은 송 교수와 일문일답.
▶현재 HIV 치료는 어떻게 이뤄지나.
"과거에는 한 번에 한 움쿰씩 (여러 알을) 복용해야 했다. 소위 칵테일 요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 종류의 약제를 종류 당 두세알씩 먹어야 했다. 약 크기도 크고 색깔도 특이해서 복용 시 타인에게 노출되는 낙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개발된 경구용 치료제는 하루에 한 알만 복용하면 되고, 알 크기도 작아 일반적인 혈압약이나 소화제와 구분하기 어렵다. 부작용도 현저히 줄어들면서 복약 순응도가 높아졌으며, 과거에 식사와 함께 약을 복용해야 했던 제한점도 대부분 사라졌다. 이에 따라 감염인의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됐다."
▶최근에 주로 사용하는 치료제는 2제, 3제 경구 요법으로 알고 있다. 경구 치료제는 어떤 게 있고 특징은 무엇인가.
"현재 사용하는 약제로는 단일 정제 형태(single tablet regimen)인 2제 경구제 도바토, 3제 경구제 빅타비(빅테그라비르+엠트리시티타빈+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 이하 3제 요법)가 있다. 도바토는 2개 약제가 하나의 정제로 된 형태이고, 3제 요법은 3개 약제가 하나의 정제로 된 형태다.
도바토 등 단일 정제가 나오기 전에는 복용해야 하는 알약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단일 정제에 들어있는) 약제의 수가 줄어들면 장기 복용 시 3제를 복용했을 때보다 2제를 복용했을 때 확률적으로 부작용이 줄어든다.
과거 사용하던 3제 요법에는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Tenofovir disoproxil 이하, TDF)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신기능 저하 및 골밀도 감소 부작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후 TDF가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enofovir Alafenamide 이하, TAF)로 변경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개선됐다. 그러나 TAF는 체중 증가, 고지혈증, 중성지방 또는 콜레스테롤 증가로 인한 지방간,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장기 복용 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진단되는 감염인의 약 60%가 20, 30대 젊은 연령층이며 이들의 기대수명이 약 80세로 길기 때문에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체중 증가,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등 부작용 발생빈도가 적을수록 좋은 약제라고 보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약제를 선택한다."
▶2제, 3제 요법 모두 비슷한 부작용이 있나.
"TDF 기반 복합제와 비교했을 때 도바토의 상대적인 장점은 신장 기능의 저하나 골밀도 감소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관련 내용은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 도바토는 2030 젊은 감염인이 진단 후 약 20~30년 간 약제를 복용하며 40~50대가 되었을 때 당뇨, 고지혈증, 체중 증가 등 장기적인 부작용 발생 위험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
물론 3제 요법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 3제 요법이 TDF에서 TAF로 변경되며 신기능 저하나 골밀도 감소 문제는 상당히 해소됐다. 하지만 반대로 체중 증가, 고지혈증, 인슐린 내성과 같은 대사 장애의 발생 위험이 조금 증가하는 경향은 여러 임상 시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단일정 형태의 복합제제라는 측면에서 2제요법과 3제 요법 차이는 큰가.
"단순히 복약 순응도 측면에서는 두 약제 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 본다. 다만 복합제는 각각의 성분이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단일 정제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두 가지 성분만으로 (질환의) 조절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약제 수를 줄이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 물론 내성이 문제가 된다면 사용이 어렵겠지만 도바토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불식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사용하는 HIV 치료제들의 내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초기 HIV 치료에서는 NRTI, NNRTI, 프로테아제 억제제(PIs) 3가지 계열 약제를 사용한다. 하지만 프로테아제 억제제는 약제 종류가 적고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아, NRTI와 NNRTI만 사용했을 때 내성 발생률이 높았다. 2015년 전후 개발된 인테그라제 억제제(Integrase Inhibitor)는 바이러스 억제 효과와 내성 장벽이 높아 HIV 치료 효과가 크게 좋아졌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어 감염인의 삶의 질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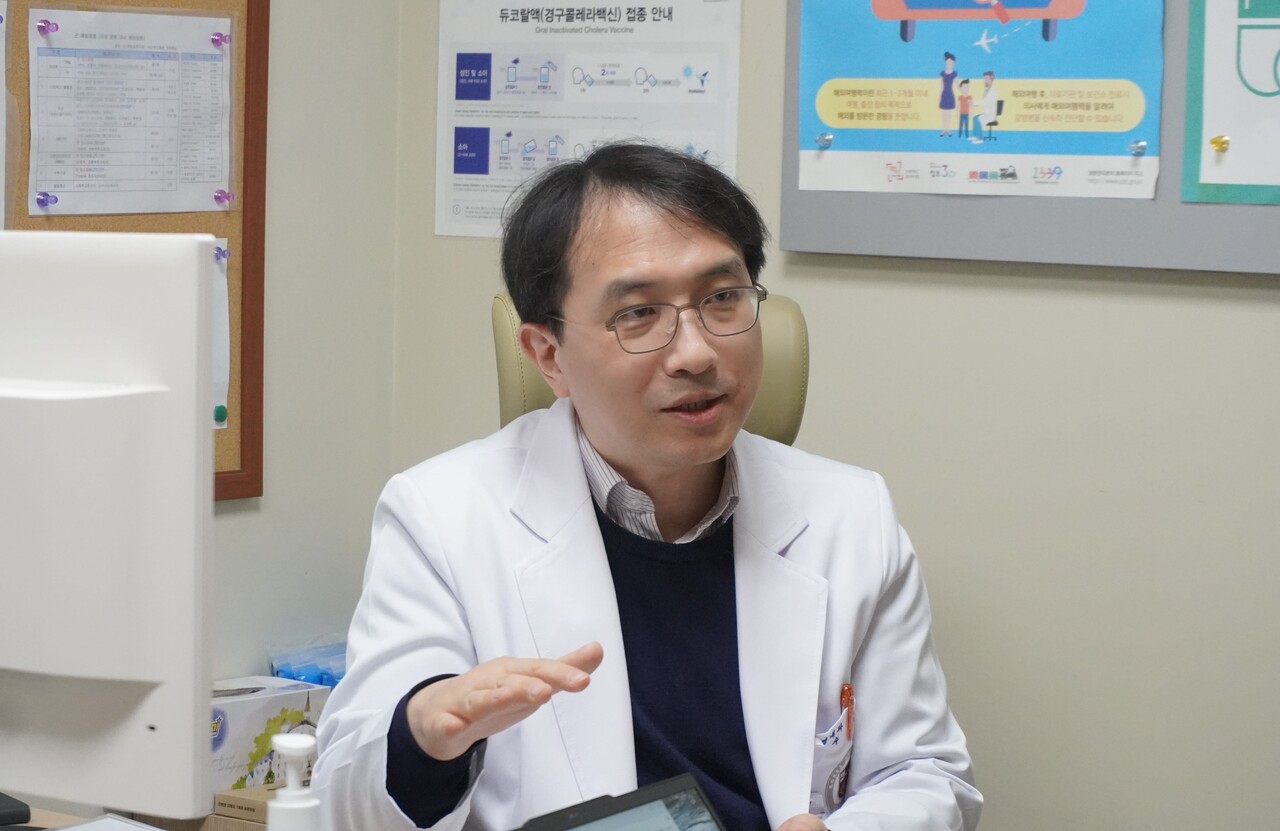
▶현재 HIV 치료 목표는 기본적으로 장기 치료를 중요시하는 것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2제 요법과 3제 요법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3제 요법은 세 가지 약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 도바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강력하고, 내성 장벽이 높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다. 물론 내성이 빈번하다면 이는 큰 장점일 것이다.
때문에 처음 도바토가 허가됐을 당시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감염인에게는 권장하지 않았다. 점차 많이 사용하면서 실제 임상 연구에서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감염인에서도 비열등한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보이며 내성 유발 빈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3제 혹은 4제 요법을 복용하던 감염인에서 스위칭(switching)한 경우에도 도바토는 동등하거나 비열등한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보여주었고, 최대 5년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성 발생 빈도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결과들도 보고됐다. 현재는 초치료 감염인(*기존 치료 이력이 없는, naÏve)에게 도바토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도바토를 초치료에 사용하는 이유도 바이러스 억제 효과 때문인가.
"이전에는 초치료 때 내성 결과를 확인하거나 바이러스 농도를 확인하고 나서 치료를 했었다면, 최근에는 여러 연구에서 '진단 후 즉시 치료(Same-day treatment)'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바로 치료를 진행할 시 여러 검사 결과를 보고 치료하는 경우보다 에이즈 관련 이벤트나 관련 질환 발생, 사망률, 치료 중단 확률 등이 낮아지고 바이러스 억제 효과도 상대적으로 더 좋다는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도바토를 초기 치료 약제로 사용한 경우, 3제 요법과 마찬가지로 5년까지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서 바이러스 부하가 50만 copies 이상으로 높은 경우나 CD4+ T세포 수가 200개 미만인, HIV가 상당히 진행된 감염인에서도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개선할 것으로 보여 초치료 약제로 도바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환자 만족도 조사 등 환자 보고 결과(patient reported outcome, PROs) 연구에서도 3제 요법대비 2제요법인 도바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이상 반응 발생 빈도도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실제로 현재 우리 병원에서 도바토 처방 비율은 약 30~4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진도, 환자도 만족스러운 결과로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치료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 실제 진료 환경 내 연구
12개월 이상 추적 가능한 도바토 복용 HIV 감염인 151명 대상으로 진행한 단일기관 후향적 관찰 연구에서 기존 치료 유무와 관계없이 도바토의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기존에 치료받지 않았던 HIV 감염인 그룹(20명)의 95%에서 치료 6개월, 12개월 차에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고, 도바토 스위칭 그룹에서도 지속적인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 추적 관찰기간 동안 치료 중단 또는 체중, 지질 프로필, 간 기능 이상 등 심각한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일본 - 테이쿄(Teikyo) 대학병원 방문 HIV 감염인 대상 전향적 관찰 연구
HIV 감염인 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향적 관찰연구의 환자 보고 결과(Patient-Reported Outcomes, PROs), 49명의 HIV 감염인 중 도바토로 전환한 13명의 정신적 요소 요약 점수(Mental Component Summary, MCS)와 수면의 질 지수(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 도바토 스위칭 감염인 대상 장기 추적 결과
도바토로 스위칭 후 바이러스가 억제된 HIV 감염인 785명 대상 이탈리아 다기관 장기 추적 결과, 바이러스 억제 유지율은 96주차 97.7%, 144주차 96.9%, 240주차 96.4%로 나타났다. 치료 유지율은 96주차 82.9%, 144주차 79.7%, 240주차 74.3%로 나타나, 도바토의 장기 효과 및 내약성을 확인했다.
▶기존 HIV 감염인에서 약제를 스위칭하는 건 어떤 경우인가.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바꿀 것 같다. 예를 들어 3제 요법을 복용하는데 체중 증가 또는 고지혈증이 심한 경우는 약제를 바꿔볼 수 있을 것 같다. 신장 기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혹 신장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고려할 것 같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HIV 감염인이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신기능 부전 등 동반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골다공증도 상당히 빈도가 높다. 이전에 TDF 제제를 사용할 때는 골밀도 감소 빈도가 높았지만 이는 (TAF 제제로 변경되며) 일정 부분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IV 감염인의 골밀도 감소 빈도는 비감염인 대비 높기 때문에, 연 1회 정도는 골밀도 검사를 반드시 진행하고, 필요 시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는 환자들도 상당히 있다."
▶기존 3제 요법을 쓰다가 2제 요법으로 스위칭했을 시 부작용 등 영향은 어떤가.
"현재 시점에서 2제 요법의 치료 실패나 내성 출현 관련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초기 치료 감염인에게 도바토를 사용하거나 기존 3제 요법에서 도바토로 스위칭한 경우, 5년 추적 연구에서도 3제 요법 대비 바이러스 억제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 실패 사례에서도 내성이 거의 확인(detection)되지 않았다.
위험성(risk)과 치료 혜택(benefit)을 고려해야 하는데, 치료 실패나 내성 출현 위험은 높지 않고, 장기간 복용 시 대사 장애의 위험이 낮은 혜택이 있다면 이러한 약제를 선택하는 것에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현재 사용하는 단일정 복합제제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좋다는 생각이 든다.
"도바토와 3제 요법 모두 효과가 좋고 장기 복용 시 부작용 발생 빈도에도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최근에는 장기 복용 시 고지혈증, 골밀도 감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동반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어떠한 약제가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이점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젊은 감염인에게는 장기 복용을 고려해 도바토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2제 요법과 3제 요법을 비교한 임상 연구 결과는 어떤가.
"먼저, 연구 결과 전에 HIV 완치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HIV 완치가 어려운 이유는 현재 사용 중인 약물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하기 때문이다.
내가 치료한 감염인의 98%는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다. 아마 복약 순응도가 좋은 것 같다. 하지만 만약 약을 끊는다면 100% 재발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제가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이 때 HIV 바이러스는 숙주(host) 세포의 DNA에 통합(integration)되어 잠복 상태로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 잠복 상태의 바이러스 DNA를 프로바이럴 DNA(Proviral DNA)라고 한다. 일종의 바이러스 저장소라 볼 수 있다. 복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잠복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된 의료 기술로는 이 프로바이럴 DNA를 제거할 수 없다. 만약 항바이러스 치료를 중단하면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application)된다. 이러한 이유로 HIV의 완치가 불가능한 것이다.
RUMBA 임상 연구는 도바토와 3제 요법을 직접 비교(Head to Head)한 4상 연구로, 바이러스 억제 효과 및 면역학적 치료 효과를 평가했다. 이 연구에서 프로바이럴 DNA에 대한 영향도 평가했다. 연구진은 CD4+ T세포에서 프로바이럴 DNA를 추출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했으며, 3제 요법 유지군과 도바토로 스위칭한 군의 프로바이럴 DNA의 농도 변화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 두 군 간 프로바이럴 DNA 농도 변화에는 차이가 없었다. 농도의 증가 추세를 보고자 한 것이었는데, 농도는 증가하지 않고 기존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확인됐다. 즉, 바이러스 저장소에 대한 영향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또 만성 염증과 관련된 조사도 이뤄졌는데, 기존 요법에서 도바토로 스위칭했을 때 염증 마커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만성적인 염증 또는 비특이적인 염증은 HIV 감염인의 면역 기능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2024년 9월 발표된 RUMBA 연구는 3제 요법에서 2제 요법 도바토로 스위칭 시 잠재적 이점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한 전향적 RCT 연구다. 최초로 도바토(DTG/3TC)와 3제 요법(B/F/TAF) 간 바이러스 억제율과 안전성을 viral reservoir로 비교 분석했다.
89명이 도바토로 스위칭 군으로, 45명이 3제 요법(B/F/TAF) 유지군으로 무작위 배정됐다. 도바토 2제 요법은 3제 요법 대비 비열등한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입증하고, HIV-1 전사에 의한 활성 저장소의 증가 또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나 주요 면역 세포 하위군의 유의미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임상 48주 차에 도바토 투약군은 3제 요법 유지군과 비교해 106 CD4+T 세포당 HIV-1 DNA 복제수의 증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바이러스 억제 효과 및 대사 결과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면역학적 지표에서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주요 면역세포 하위 집단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 하위 분석 결과, TAF 경험이 없는 환자군에서 도바토 스위칭 그룹은 48주차 체지방률 평균 증가가 3제 요법(B/F/TAF) 유지군 대비 유의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HIV 감염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HIV 감염인들은 낙인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사회적 노력을 통해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지워가야 할 것이다. 진료하는 감염인 분들 중에서도 일상생활 하시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HIV도 다른 만성질환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언젠가는 HIV 완치제가 개발될 것이라 믿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