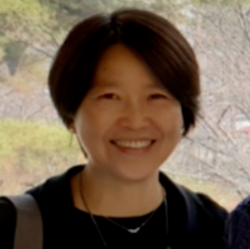
기관지확장증은 드물지 않게 발병하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 올해 여름 FDA의 승인을 받은 브렌소카팁(상표명 브린서프리)이 이 질환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첫 약물이다. 하루 한 번 경구 투여하는 저분자 화합물이다.
기관지에서 염증이 만성적으로 발발하여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 세균 감염이 다시 염증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일어나 기관지확장증이 악화된다. 약물 치료는 항염증제를 사용하여 증상을 완화하고 기관지확장제나 항생제를 사용하여 급성의 악화를 억제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브렌소카팁은 기관지확장증의 악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최초의 약물이다. 임상시험에서 브렌소카팁이 환자의 기관지확장증 악화를 저지하는 효과를 나타내어 약물로 허가를 받았다.
브렌소카팁은 기관지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의 최상위 단계에서 작용한다. 기관지확장증이 진행될 때 염증과 감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중심에 호중구가 있다. 호중구는 면역세포의 한 종류이다.
체내에 침투한 감염원과 가장 먼저 접촉하여 포식 작용을 통해 감염원을 제거한다. 기관지확장증에서 호중구의 과다 활성화가 문제를 유발하며, 증상이 심각할수록 기관지에 활성화된 호중구가 많다. 브렌소카팁은 호중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여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하고 감염을 억제한다.
호중구는 다른 혈액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골수에서 생성된 후 활성화 과정을 거쳐야 적재적소에서 면역세포로서 기능을 발휘한다.
이미 활성화된 호중구를 억제해 보아도 기관지확장증의 진행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약물 개발의 시행착오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 기관지에서 염증을 유발하기 이전에 호중구를 활성화하지 못하게 하는 약물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브렌소카팁은 호중구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약물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DPP1 억제제이다. DPP1은 호중구의 활성화 과정에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단백질이다. 브렌소카팁은 DPP1을 억제함으로써 호중구의 활성화를 막는다.

DPP1 유전자의 결함이 있는 극히 희귀한 유전질환이 알려졌다. 특이하게도 환자들이 치주염과 피부 각질화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면역 이상 증상을 신체 전반에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DPP1의 기능을 억제해도 면역 결핍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지 않으리라는 가설을 가지고 DPP1이 약물 개발의 타깃으로 부상했다.
DPP1 억제제 약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화합물이 접근하여 기능을 억제하기에 DPP1 단백질이 구조적으로 까다롭다. 개발자들은 단백질 구조에 맞추어 화합물을 디자인하고 합성했다.
GSK가 합성한 DPP1 억제제가 약물 개발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되었지만, 이 화합물이 피부의 박리를 일으키고 무엇보다도 인체 내에서 호중구의 활성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여 개발이 중단되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2세대 DPP1 억제제 중 하나가 기대를 받았지만, 동물 실험에서 혈관에 축적되어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임상시험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좌초되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음으로 개발한 브렌소카팁이 DPP1 억제제 중에서 처음으로 기관지확장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진출했다.
브렌소카팁은 환자에게서 질환의 악화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감염에 특별히 취약하게 하거나 피부 박리를 일으키는 부작용을 우려한 만큼 나타내지 않아 약물로 승인되었다.
브렌소카팁이 최초의 DPP1 억제제 약물이라고 강조하는 배경에는 다른 염증 질환으로 확장하여 사용될 잠재력 때문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낭성섬유증(cystic fibrosis)과 같은 폐질환뿐만 아니라 사구체신염, 혈관염, 심지어 류머티스 관절염과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환에서 호중구의 과다 활성이 관여하며, DPP1 억제제가 이들 질환에 대하여 사용될 여지를 가진다.
브렌소카팁 외에도 베링거인겔하임이 개발하는 BI1291583과 중국의 제약사가 개발하는 HSK31858 등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DPP1 억제제들이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