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추석 연휴에 맞닥뜨린 예상치 못한 고관절 부상이 이제 다 나아갑니다. 문득이랄까요, 어느새 노화가 재생과 회복의 속도를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아프고 나니 그동안 간과했던 우리 몸의 코어 근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사실 그 무엇 하나 우리 신체에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요.
그럼에도 50세 이후일수록 허벅지로 대표되는 대퇴사두근, 엉덩이의 대둔근·중둔근 그리고 허리의 기립근 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코어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에서 걷기, 뛰기, 계단 오르내리기와 같은 기본적인 신체 활동과 꼿꼿한 자세 유지에 심각한 불안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간 치료를 위해 병원과 약국을 자주 오갔습니다. 요즘 동네를 둘러보면 새로 생기는 가게 중에 병원과 약국이 유독 많습니다. 한때 카페와 옷 가게가 즐비하던 자리에 이제는 정형외과, 재활·통증의학과, 치과, 피부과 간판이 줄줄이 들어서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곳에 개원한 의사나 개국한 약사들이 대부분 30~40대의 젊은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친절한 진료와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이려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요즘 젊은 의사·약사는 예전보다 훨씬 다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일 겁니다. 이런 변화를 보며 문득 궁금해집니다.
의료인의 나이와 실력은 정말 비례할까?
마케팅에서 ‘티핑 포인트’로 유명한 맬컴 글래드웰은 2008년 펴낸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10년, 즉 1만 시간 동안 꾸준히 연습하면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비유하자면 한 우물을 10년 이상 판 사람은 그 분야에서 일가(specialty)를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하지만 ‘1만 시간의 법칙’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글래드웰이 아닙니다. 1993년 앤더스 에릭손 등의 연구자가 제시한 ‘의도적 연습(deliberate practice)’ 개념을 글래드웰이 인용해 1만 시간을 마법의 숫자로 대중에게 포지셔닝한 것이지요.
이후 여러 연구자가 이 법칙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핵심은 모든 영역과 모든 사람에게 1만 시간이 필요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릭손 역시 시간의 총량이 아니라 연습의 질과 설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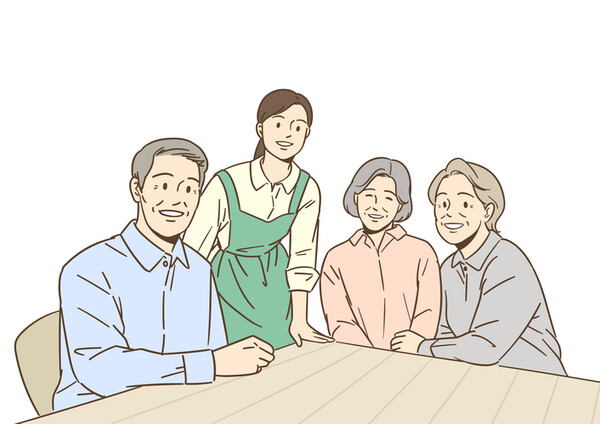
직업에 따라 연습의 질과 인지능력, 학습 자원 등이 성과, 즉 숙련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험의 총량보다는 피드백의 질, 학습의 갱신 주기,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숙련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요컨대 무작정 오래 한다고 해서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의료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순히 오랜 경험이 숙련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료 기술과 치료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보다 ‘얼마나 배우고 업데이트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Tsugawa et al., 2017), 나이가 많은 의사일수록 환자의 사망률이 다소 높았지만, 최근까지 활발히 진료하고 최신 지식을 꾸준히 쌓아온 의사는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보다 ‘배움의 지속성’이 숙련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년기의 환자는 단순히 노화에 의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삶의 역사와 기억을 가진 사람, 즉 오랜 시간을 살아온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 하나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진료의 기술만큼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노년학에서는 이를 ‘인간 중심 돌봄(person-centered care: PCC)’이라 부릅니다. 질환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접근법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과거 직업, 가족관계, 생활 습관, 두려움 등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의사와 약사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순간 환자는 단순한 ‘진료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는 인간’으로 느끼게 됩니다. 또한 노년층은 인지능력, 청력, 시력이 저하되어 정보를 이해하는 속도와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의료인은 전문 용어를 줄이고, 천천히, 시각 자료나 구체적 예시로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버서비스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단순히 7P 믹스 중 하나인 ‘사람(People)’이 제공하는 친절이 아니라 서비스 가치의 핵심 요소이자 서비스 여정상의 터치포인트, 즉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입니다.
아무리 오랜 경험을 쌓았더라도 환자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경험은 금세 낡아버립니다. 반면 젊은 의료인이라도 경청과 공감, 세심한 설명으로 신뢰를 쌓는다면 그는 이미 숙련된 전문가일 것입니다.
결국 의료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태도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마음의 질이 의료인의 진짜 실력을 결정합니다. 모쪼록 잊지 말고 꼭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글: 숙명여자대학교 실버비즈니스학과 이충우 교수
* 외부 필자의 기고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